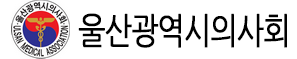| 에로스와 프쉬케 | |||||
|---|---|---|---|---|---|
| 작성자 | 이복근 (211.♡.20.21) | 작성일 | 08-03-25 21:51 | ||
 로마 작가 아풀레이우스의 긴긴 에로스와 프쉬케 이야기를 줄여보면 이렇다. 옛날 어떤 나라에 공주가 셋 있었다. 첫째와 둘째도 아름답기는 했지만 막내 프쉬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막내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잊고 프쉬케만 칭송했다. 화가 난 여신은 아들 에로스에게, 프쉬케에게 사랑의 화살을 한 대 쏘아 사랑에 빠지게 하되, 아주 추악한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에로스는 어머니가 당부한대로 프쉬케에게 쏠 사랑의 화살을 준비했다. 그런데 신들이 무슨 조화를 부렸던지 에로스 자신이 그만 화살촉에 찔리고 말았다. 에로스는 바로 그 순간 프쉬케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에로스는 신이어서 인간인 프쉬케를 드러내어놓고 사랑할 수 없었다.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부탁, 프쉬케의 아버지에게 신탁을 내리게 했다. 프쉬케를 피테스 산 산신령에게 아내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딸을 산신령 괴물과 혼인하게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프쉬케는 아버지에게 화가 돌아갈까봐 그 신탁을 좇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미녀와 야수’의 미녀처럼). 아름다운 공주 프쉬케가 산으로 떠나는 날 나라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왕은 신탁에 따라 프쉬케를 산꼭대기에 남겨두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쉬케는 서풍의 신 제퓌로스의 안내를 받고 괴물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괴물이라는 신랑의 모습은 한번도 보지 못한 채로 신혼을 보냈다. 신랑은 늘 한밤중에 들어갔다가 날이 새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는 했다. 프쉬케는 신랑의 모습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신랑은 신방에다 불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의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궁금증을 이길 수 없었던 프쉬케는 어느 한밤중에 등을 켜고 신랑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신랑은 괴물이 아니라 금빛 고수머리가 양털같고 이목구비도 눈처럼 흰 미소년이었다. 어깨에는 밤이슬에 젖은 날개도 두장 달려 있었다. 바로 에로스였다. 프쉬케는 신랑의 풍채에 넋을 놓고 있다가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을 그의 어깨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기겁을 하고 깨어난 에로스는 프쉬케를 꾸짖었다. ‘어리석구나 프쉬케여.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의심이라는 말인가. 에로스(사랑)는 의심하는 프쉬케(마음)에는 깃들이지 못한다.’ 에로스는 이 말 한 마디를 남기고는 밤 하늘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프쉬케는 에로스를 찾아 온 그리스 땅을 방황하다가 대지의 여신의 도움을 받아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 들어갔다. 여신은 프쉬케를 꾸짖기부터 했다. ‘이 믿음이 적은 하찮은 것아. 에로스는 너같은 것을 사랑하더니 어깨에는 화상, 가슴에는 열상을 입고 몸져 누웠다.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여신은 프쉬케를 신전 곳간으로 데려갔다. 곳간에는 밀·보리·기장 같은 곡식이 서로 섞인 채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여신이 명령했다(‘신데렐라’와 ‘콩쥐팥쥐’에 나오는 심술궂은 계모들처럼). “저기 있는 곡식을 종류별로 고르되 한 알도 남김없이 골라 놓아라.” 프쉬케는 기가 꺾여 앉아서 눈물만 떨구었다. 그 때 개미떼가 밀물처럼 몰려와 그 일을 대신 해주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다음날 여신이 맡긴 일은 훨씬 위험한 것이었다. 강둑에 황금색 털이 난 양떼가 있는데 가서 털을 조금씩 베어오되 어느 양의 털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프쉬케는 물가로 내려갔지만 양이 사납고 마릿수가 너무 많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물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손을 써서 갈대에다 양털을 걸어두게 할 테니까 있다가 거두어 가세요.” 강의 신이었다. 해그름에 프쉬케가 갈대밭으로 나가보았더니 모든 양의 털이 골고루 갈대에 걸려 있었다. 프쉬케는 황금 양털을 한 아름이나 거둘 수 있었다.  지하세계로부터 돌아온 딸 페르세포네를 반기는 케레스. 은은한 색채와 함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여신의 세번째 명은, 저승 세계로 내려가 저승 왕비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을 조금 얻어오라는 것이었다. 저승 왕비를 만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일으킨 기적으로 프쉬케는 저승왕비를 찾아갈 수 있었다. 저승왕비는 ‘아름다움’이 든 상자를 하나 주면서, 인간은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프쉬케가 누군가? 에로스, 즉 ‘쿠피도(호기심)’의 아내가 아닌가? 프쉬케는 인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 보았다. 상자 속에 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휘프노스(잠)’였다(그래서 미인은 잠이 많은 법인가). 프쉬케는 잠이 들었다.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그 잠은 곧 죽음일 터였다. 어깨의 화상 치료를 끝낸 에로스가 그 잠을 깨워주고는 제우스에게, 사랑의 끝을 아름답게 맺어줄 것을 청원했다. 제우스의 중재로 프쉬케가 아프로디테와도 화해하고 에로스와 정식으로 혼인한다.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니 이 딸의 이름은 라틴어로 ‘볼룹투스(쾌락)’이다. 시인 김정란 교수는, 좋은 글을 읽으면 “육체로부터 에로스, 프로이트가 ‘자기 유지능력’이라고 불렀던 생의 구체적 볼륨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고 쓴 적이 있다. 그의 절묘한 표현에 따르면 에로스=자기 유지능력=생의 구체적 볼륨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이 에로스가 빠져나간 상태를 ‘무(武)의 손가락에 편안히 자신을 맡기’게 되는 상태라고 썼다. 그리스신화에는 두 에로스 신이 등장한다. 먼저 등장하는 신은, 광막한 공간 카오스(혼돈), 가슴이 넓은 가이아(대지)에 이어 나타나는, 생성과 결합의 힘을 지닌, 살아 있는 것들의 사지를 노곤하게 하는 에로스 신이다. 만물을 생성시키는 힘이기도 한 이 신은 항렬이 아주 높아 족보를 따지자면 제우수의 증조뻘이 된다. 그리고 두번째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신 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사랑의 꼬마 신 에로스다. 이 둘은 다른 신이면서도 신격(神格)은 동일하다. 아무래도 꼬마 신 에로스는 가이아 시대 에로스가 인격화(人格化)한 것 같다. 애욕의 여신과 전쟁신의 아들인 꼬마 신 에로스의 화살에 맞은 신이나 인간은 모두 전쟁이라도 치르듯이 사랑의 열병을 앓아야 한다. 이 열병은 어느 한쪽이 소진되지 않는 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의 손가락에 편안히 자신을 맡길 수 없게 하는’ 에로스의 조화는 곧 번뇌의 씨앗일 수도 있겠다. 에로스는 나이를 먹지도, 자라지도 않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도 ‘안테로스’를 만나면 나이를 먹고 자란다. 안테로스는 무엇인가? 에로스의 신상(神像)은 복수(複數)로 그려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욕망의 다양한 형태를 상징하는 이 복수 에로스, 즉 ‘에로테스’다. 에로스 상이 복수가 된 이면에는 두 소년의 슬픈 전설이 있다. 미소년 멜레스는 아테나 시민, 티마고라스는 ‘메토이코스’, 즉 외국인 거류민이었다. 멜레스를 사랑한 티마고라스가 동성애를 고백하자 멜레스는, 정말 사랑한다면 아크로폴리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느냐고 했다. 티마고라스가 실제로 아크로폴리스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자 멜레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친구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었다. 아테네 시민들이 멜레스의 죽음을 슬퍼하여 아크로폴리스에도 에로스 상을 세우자 외국인 거류민들은 ‘안테로스’상을 세웠다. ‘안테로스’는 ‘상대가 있는 사랑’이라는 뜻이다. 헌헌장부가 된 에로스를 보라. 에로스에게는, 의심하지 않는 프쉬케(마음)가 안테로스였다. <새 천년을 여는 신화 에세이> ,이윤기 문화일보 / 2000년 1월 14일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