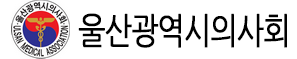| 마르시아스와 피그말리온 | |||||
|---|---|---|---|---|---|
| 작성자 | 이복근 (211.♡.20.21) | 작성일 | 08-03-25 22:14 | ||
 <사진> 귀도 레니의 그림 ■마르시아스가 껍질이 벗기어진 이야기 문예지 ‘문학동네’(1999) 겨울호의 표지를 훑어보다가 나는 가볍게 놀랐다. 소설 필자 중에 ‘선데이 마르시아스(Sunday Marsyas)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국적불명인 작가가 기고한 단편소설 제목은 ‘미(美)’. 어느나라 사람일까. 필자의 정체가 궁금할 수밖에. 작가의 프로필을 읽어 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한국 이름은 ‘심상대’. 심상대라면, 벌써 세 권의 소설집을 펴낸, ‘젊은’ 중견 반열에 드는 소설가, 마흔 살 나이에 예술대학 들어간, 오기만만한(!) 사내다. ‘선데이’는 이름 ‘상대’를 영어식으로 익살스럽게 쓴 것일 터이다. 그렇다면 ‘마르시아스’는 무엇인가. 그는 왜 이런 이름을 쓰고자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신화 속 고유명사 빌려쓰기는, 패배할 경우, 산채로 껍질이 벗기어질 각오를 하고 예술의 신(神)과 한판의 대거리를 해보겠다는, 오기(!)로 가득찬 선언이다. 신화를 아는 사람은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한 이 상징적 언어를 단박에 알아듣는다. 중국 시인 이태백은 스스로를 적선(謫仙), 곧 ‘인간 세상으로 귀양온 신선’이라고 불렀다. 그리스 신화에도 적신(謫神), 곧 ‘인간 세상으로 귀양온 신’이 흔하다. 음악과 예술의 신 아폴론이 귀양살이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마르시아스’라는 이름의 강신(江神)이 피리 한 자루를 주웠는데, 신통한 피리여서 입술에 대기만 해도 아름다운 가락이 절로 흘러나왔다. 강신은, 악신(樂神) 아폴론도 부럽지 않다면서 재고 다니며 이 피리를 불었다. 귀양살이하고 있던 악신이 그 소문을 듣고는, 강신을 찾아가 자기의 수금(竪琴) 솜씨와 한번 겨루어 보겠느냐고 했다. 강신이, 무슨 내기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악신은, 이긴 쪽은 상대의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내기를 대신하자고 대답했다. 둘은 겨루기에 들어갔다. 심판은, 신들 쪽에서는 무사이(뮤즈) 아홉 신녀(神女), 인간 쪽에서는 미다스왕이 맡기로 했다. 시합 끝에 판정이 나왔다. 무사이 아홉 신녀들은 악신 아폴론의 수금 솜씨가 낫다고 했고 미다스 왕은 강신 마르시아스의 피리 솜씨가 낫다고 했다. 9대1이니 아폴론의 승리였다. 아폴론은 감히 악신과 겨루어 보겠다고 나선 마르시아스의 껍질을 산채로 벗겼다. 마르시아스를 편든 미다스에 대해서는, 악신의 가락도 알아듣지 못하다니 그것도 귀냐면서 그의 귀를 나귀 귀로 만들어 버렸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삼국유사’, 제2권‘ 기이(紀異)’편에 실려 있는 ‘경문왕의 당나귀 귀’ 이야기와도 기이할 정도로 아주 똑같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산 채로 껍질이 벗기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신과의 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은 마르시아스의 오기다. 심상대는, 소설을 대충대충 쓰지 않고 마르시아스처럼 질 경우 껍질을 벗기겠다는 태도로 문학에 임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신화의 상징적인 언어란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손(Midas touch)’으로도 유명한 미다스는, 기원전 15세기 경 프리기아 땅을 다스리던 실제 인물 고르디오스의 아들이다. 내가 가서 보았거니와, 터키의 앙카라 박물관에는 고르디오스의 유골이 있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3천5백년 전의 프리기아를 무대로 하고 있는 셈인데, 심상대는 그 해묵은 상징적인 언어 ‘마르시아스’의 잠을 깨워 ‘사나이 결심’을 웅변적으로 천명하는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피그말리온이 아내를 얻은 이야기 오드리 헵번이 여주인공역을 맡은,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라는 영화가 있다. 한 음성학자가, 사투리를 찍찍 내뱉는 미천한 하류층 여성을 하나 골라 어법과 화법을 공들여 교정한 뒤 귀부인으로 만들어 사교계에 등장시켰다가, 마침내 그 여성에게 반해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의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원작의 제목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마르시아스와 정반대되는 예술가의 운명을 상징한다.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믿는 조각가다. 손재주가 어찌나 좋았던지 ‘에픽토이오스 헤파이스토스(지상의 헤파이스토스)’로 불리기까지 했다. 그의 고향 처녀들은, 나그네를 박대하다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나그네에게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처녀들이 다투어 항구를 누비며 몸 파는 꼴을 보고는 그만 싫은 마음이 생겨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싫은 마음 때문만도 아니었다. 예술가인 그에게 여자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상아를 여러 개 모으고 그 뛰어난 손재간으로 이를 짜 맞추어 사람 크기만한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치수 가늠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아프로디테 여신이 다 얼굴을 붉힐 만했다. 게다가 그가 여인상을 ‘갈라테이아’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무엄하게도 여신을 의중에 두었던 듯하다.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떠올랐듯이 갈라테이아 역시 바다에서 솟아오른 신녀의 이름이다. 그는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도 정말 살아 있는 처녀로 보였던지, 눈길 갈 때마다 손가락을 대어 보고는 했다. 그러나 댈 때마다 번번이 손가락을 타고 건너오는 것은 싸늘한 상아의 촉감뿐이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아 처녀에게 정이 들었기에 그랬겠지만, 그는 이따금씩 처녀를 안아 보기도 하고 품어 보기도 했다. 출타할 일이 있으면 처녀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 가령 예쁜 조개껍데기, 생김새가 희한한 돌, 호박 구슬, 진주 구슬 같은 것을 사다 주기도 했다. 정이 더 깊어지자 상아 처녀에게 옷을 입히기까지 했다. 옷을 입히니 잘 어울려서 벗고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러나 입고 있을 때가 더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녀의 옷을 자주 벗기고는 토닥거렸다. ‘아름다워서 좋고, 말이 없어서 더욱 좋은 내 아내 갈라테이아….’ 마침내 아프로디테 여신의 축제가 벌어지는 ‘아프릴리스(4월)’가 왔다. 축제 기간이면 신전에는 제물이 산을 이루고 유향 연기가 구름을 이루었다. 그도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단에 유향을 사른 뒤 은밀하게 빌었다.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짓게 하시는 여신이시여. 사랑과 아름다움을 함께 얻지 못할 이 남루한 예인(藝人)에게 내리소서. 상아 처녀같이 아름다워서 좋고, 말이 없어서 더욱 좋은 처녀를 내리소서.’ 그는 차마 ‘상아 처녀’를 빌지 못하고 ‘상아 처녀 같은 처녀’를 빌었다. 아프로디테가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그 뜻을 전했다. ‘네가 깎은 상아 처녀가 아름답고 네가 기울이는 정성이 지극하다. 향연이 세번 하늘로 춤추면서 오르거든 내가 이 인연을 아름답게 지어 주는줄 알라. ’ 물론 여신의 뜻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향연이 세번 춤추면서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고도 그 뜻을 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림은 쟝 레온 제롬(Jean Leon Gerome, 프랑스, 1824-1904)이 그린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그림은 쟝 레온 제롬(Jean Leon Gerome, 프랑스, 1824-1904)이 그린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 상아 처녀 위로 몸을 구부려 가볍게 입술을 맞대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입술에 온기가 느껴졌다. 4월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처녀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처녀의 가슴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젖가슴을 찔러 보았다. 손가락 닿은 곳이 조금 들어갔다가 발그레하게 화색이 돌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가 화들짝 놀라면서 물러서자 상아 처녀가 눈을 뜨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제단의 향연이 춤추며 세 번 까불거리며 솟아오르지 않던가요. 상아의 아름다움을 제 생명으로 불러낸 가난한 피그말리온이여.’ 바라건대 ‘선데이 마르시아스’가, 신화에서처럼 산 채로 껍질이 벗겨질 각오로 예술의 신과 한판 대거리를 해보되, 마침내 피그말리온처럼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의 가피(加被)를 입어 상아처녀의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불러내게 되기를.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