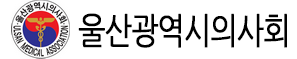| 인적 드문 산속, 바람 소리만이 날 반기네 | |||||
|---|---|---|---|---|---|
| 작성자 | 이복근 (61.♡.165.145) | 작성일 | 07-03-09 17:47 | ||
|
<14> 벌재~저수령(5.3km)
 저수령을 넘어서면 촉대봉, 시루봉, 솔봉, 묘적봉 죽령 아래 도솔봉(1314m)에 이르기까지 1000M 이상의 산들이 이어진다. 단양팔경중 제4경 '사인암계곡' 절경 품고 문경땅 대간종주 100여㎞ 저수령에서 마감 눈앞에 펼쳐진 태산준령 절로 고개 숙여져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벌재에 서다. 산이 반갑게 느껴진다. 사는 일이 왠지 허전하게 느껴질 때 길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길 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때론 길 떠남도 대간산행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되곤 한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맵게 한다 '외투 입고 총을 메니 맘이 새로워…' 행군의 아침 군가처럼 장비를 점검하고 배낭을 고쳐 매어본다. 이번 구간은 지난번 낙반사고도 있고 암릉이 미끄러우니 좀 쉬어가잔다. 그리고 다친 대원이 회복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한 달간을 쉬고 구간도 벌재(620m)에서 저수령까지 짧게 잡았다. 모두들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되뇌고 싶지가 않는 기억이다. 시작부터 대간은 몸을 급히 일으킨다. 바람이 차갑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 당연한 추위다. 823봉우리를 넘어 1020봉까지는 족히 1시간이상 소요되었다. 1020봉에 올라 잠시 숨고르기를 하니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바람이 끝없이 불어온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멈추질 않는구나'(樹慾靜而風不止). 세상사에 시달리는 삶의 모습도 이러할까. 멀리 산 아래로 상, 중, 하선암과 단양팔경 중 제4경인 사인암 계곡이 한눈에 들어온다. 예부터 단양은 관동지방과 더불어 조선 최고의 경승지(景勝地)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퇴계 이황은 1548년 단양군수로 부임하여 제1경인 도담삼봉에서 구담봉, 석문등 7경을 둘러보고 경승지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옥순봉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옥순봉이 청풍 땅임을 알고 청풍부사에게 단양으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옥순봉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 새겨 놓았었다. 단양의 옛 이름은 단구이고 선계(仙界)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리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청풍부사는 옥순봉을 단양으로 편입시켜 단양팔경 이름을 얻게 했던 것이다. 땅은 사람으로 인해 이름을 얻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났으니 (地因人得名而彰) 퇴계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경승을 후대에 널리 알렸던 혜안(慧眼)이 밝은 선비였다. 그 후 정조대왕은 단원 김홍도(1745~1806)를 연풍현감에 제수하여 단양팔경을 화폭에 담을 것을 명했다. 중인(中人)신분으로 궁중화가로 있던 단원을 반상의 계급이 엄연한 사회에서 현감(縣監)으로 중용한 정조의 인사 또한 가히 파격적인 것 이었다. 정조는 풍류(風流)를 즐길 줄 아는 군왕였다. 풍류의 본질을 바람(風)이요 바람의 속성은 기(氣)라 했다. 명산대찰을 주유(周遊)하며 가슴으로 바람을 맞이해야 가슴이 열리는 법이다. 그러나 세상을 마음대로 떠돌 수 없는 정조는 단원으로 하여금 단양8경을 화폭에 담아 그 화첩으로 풍광을 감상했으니 진정으로 와유(臥遊)를 즐길 줄 아는 현군(賢君)이었다. 1020봉에서 문봉재(1077m)까지는 1㎞ 남짓, 편안한 길이다. 그러나 정상 표지석엔 문복대(門福臺)로 되어있다. 또 다른 이름은 운봉산이다. 반대편 능선은 암릉이 아기자기한 도락산(984m)이고 아래계곡은 상선암으로 이어지는 단양천이다. 옛날에는 몇 날을 걸어서야 유람이 가능했던 곳이리라. 지금에야 차를 타고 두어 시간이면 족하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웬지 자신 있게 그렇다고 수긍하기가 망설여지는 시절이다. '봄 꽃, 여름 숲, 가을 잎, 겨울 산'이라했다. 눈길은 멀리 발 아래 단양팔경 계곡으로 쏠리지만 텅 빈 산속은 바람소리만 가득하다. 겨울산의 주인은 바람이다. 바람은 소리(音)가 되고 산을 만나면 장중한 악(樂)이 된다. 이렇게 산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꼭 유자서(有字書)만 경전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무자서(無字書)인 산도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한 음은 본래 소리가 없다'(至音本無聲). 음(音)은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다. 소리를 얻은(得音) 소리꾼들 사이에서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경지를 지음(知音)이라 했다. 노자(老子)의 말대로 워낙 큰 소리는 희미해서(大音稀聲)인가. 산은 늘 그랬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혹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삼십년 가까이 산으로 돌아다녔으나 지음의 경지가 멀었는지 아직 산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얼마를 더 다녀야 하나. 그러나 소리(聲)가 없어도 소리(音)를 내고 있는 것이 산이다. 멀리 발 아래 저수령(低首嶺)이 보인다. 말 그대로 고개(首)를 숙인 고개(嶺)다. 저수령(850m)은 단양군 대강면과 예천군 상리면 연결하는 시골 한갓진 고갯마루지만 대간능선 상에 있다. 옥녀봉(1077m) 아래 능선에 있는 소백목장엔 흰 눈으로 남아있던 겨울이 누더기가 되어 널려있다. 목가적인 풍경이다. 저수령까진 약 2㎞, 지척간이다. 상주 경계인 청화산에서 시작된 문경 땅 대간종주길이 저수령에서 마감된다. 대간 총거리를 680여 ㎞로 어림할 때 문경 땅 대간길은 무려 100여 ㎞가 넘는 먼 거리다. 문경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도시인 셈이다. 산은 교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저수령을 넘어서면 촉대봉(1081m), 시루봉(1110m), 솔봉(1102m), 묘적봉(1148m) 죽령아래 도솔봉(1314m)에 이르기까지 산들도 1000곒 이상으로 키를 키운다. 소백산이 가까워 왔음이다. 산이 높아지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바람에 저수령이라 했을까. 아닐 것이다. 저 높은 산들과 어깨를 겹치고 살다보니 몸이 겸손을 익혀 이름조차 저수령이 된 것이다. 언령의식(言靈意識)이리라. 지명을 빌려서라도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고개다. 고개를 넘으면 물 좋은 예천(醴泉) 땅이다. '물이 달다'는 감천(甘泉)도 있고 택리지엔 예천군 금당동(金堂洞) 북쪽은 '비록 땅이 드러났으나 병란이 미치지 않아 여러 대에 편안할 것이라' 기록되어있다. 죽령(竹嶺) 아래 풍기 금계동과 더불어 병화와 질병, 굶주림을 피할 수 있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로 십승지에 해당되는 피난처가 되었다. 한갓진 저수령은 잠시 고갤 숙이고 자신을 바라보라 한다. 조관형 수필가·동해펄프산악회장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