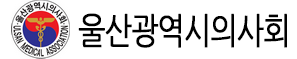| 2000년 역사 하늘재 지나 백두대간 중심에 서다 | |||||
|---|---|---|---|---|---|
| 작성자 | 이복근 (61.♡.156.253) | 작성일 | 07-01-11 17:49 | ||
|
<13> 하늘재~차갓재(19.1km)
 베바우산이라 불리는 포암산은 커다란 바위산으로 마치 베로 덮어놓은 모습같다 하여 얻은 이름이다. 포암산 전경. 156년 열린 최초의 고개 하늘재 문경 산봉우리중 으뜸 대미산 눈길 힘들지만 겨울산행 묘미 고개(嶺)는 산들이 내려와 쉬는 곳이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며 이산 저산을 불러내고 나그네도 잠시 쉬었다 가게 한다. 하늘재(520m), 백두대간 숱한 고개 중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고개이다. 옛 지명은 계립령(鷄立嶺)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으로는 156년 4월, 죽령보다 2년이나 앞서 열렸다고 되어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개인 셈이다. 대략 2000년 역사를 가진 고개에 서니 백년도 못되는 우리네 삶에서 보면 남다른 감회가 느껴지는 곳이다. '하늘가는 고갯길'이라했다. 예부터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평생 마른자리 한번 앉아 쉴 수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기에 하늘이라함은 이승의 고통을 달래 줄 이상향에 해당되는 피안(彼岸)의 땅이 된다. 그래서일까. 지명조차 하늘재 남쪽은 문경읍 관음리(觀音里)이요, 서쪽은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彌勒里)이다. 현세의 관음과 내세인 미륵을 이어주는 길이 되는 셈이니 죽어서라도 가고자 했던 하늘나라 고개가 된 것이다. 미륵은 본래 석가의 도반(道伴)이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도 석가보다 반듯했으나 게으름을 피우다 성불하지 못하고 지금도 수행 중에 있으니 언젠가 현세의 고통을 위해 현현할 미륵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하늘재 너머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지엔 커다란 미륵석불이 영험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미륵은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열락(悅樂)의 땅으로 이어주는 고개이니 하늘재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하늘재 고갯마루는 엊저녁 내린 눈으로 덮여있다. 서설(瑞雪)인 셈이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정다운 느낌에서인지 기념촬영부터 하자고 야단들이다. 하늘재에서 포암산(962m)까진 한 시간여 거리이다. 베(布)바우산이라 불리는 포암산은 커다란 바위산으로 마치 베로 덮어놓은 모습 같다 하여 얻은 이름이다. 엊저녁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미끄럽기 그지없다. 두 시간 여 만에 간신히 정상에 올랐으나 바람이 차갑다. 포암산에서 대미산까지는 10여km, 꼬박 한나절 거리이다. 800~900곒급 봉우리 8-9개를 넘고 다시 1000곒급 봉우리 3개를 넘어서야 하설산(1,028m) 아래 용하구곡으로 연결되는 부리기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많은 봉우리를 넘다보니 어릴 적 할머니께서 곧잘 해주시던 팥죽장사 할머니와 열두 고개 얘기가 생각났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배고픈 호랑이한테 팥죽 한 사발씩 퍼주다 부족해서 팔다리도 떼어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할머니, 그러나 끝내 집으로 가는 고개를 넘지 못하고 호랑이 밥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였다. 얼어버린 눈길과 낙엽에 미끄러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모두들 지친 표정이다 그나마 신참대원 1명을 844고지에서 탈출시킨 것이 다행스런 일이 되었다. 문경의 수많은 산봉우리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대미산(1115m)은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길고 긴 능선을 거느린 육산(肉山)이다. 뒤 돌아 보니 문경의 진산인 주흘산과 북으로는 장엄한 월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행출발 10시간 만에 대미산 정상에 올랐다. 정상이란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일망무제(一望無除)라 가끔 이런 곳에 서면 삶이라는 것도 공연히 궁핍하고 왜소하게 느껴지곤 한다. 왜일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 돌아갈 곳은 어데 인가'. 저 숱한 산들, 그 많던 나무들도 때가되니 훌훌 털고 각복귀기근(各復歸其根)이라 제각기 본향으로 돌아 갈 따름이다. 산도 나무도 하늘도 텅 비어있다. 나무는 잎을 땅으로 돌려보내니 만법귀일(萬法歸一)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고 바람에 몸을 맡긴 모습이니 일귀향처(一歸向處)가 된다 '만법귀일이요 일귀향처라' 경허스님 상좌인 만공스님이 불목하니 13년 만에 얻은 화두였다. 차갓재까지는 5km, 두 시간 거리이다. 추운 날씨 탓으로 눈물샘은 찾을 생각도 없이 새목재를 지났다. 키 큰 낙엽송들이 어둠속으로 하나 둘 몸을 숨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일몰이 산길을 가로 막는다. 다행인 것은 보름이 엊그제인지라 하얀 눈길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헷갈리기 쉬운 하산지점인데 철탑을 지나 차갓재( 757m)에 도착한 시간이 19:30분, 산행거리 19.1km, 12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 백두대간 중간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걷는다는 것은 발(足)과 땅이 하는 끊임없는 대화이다. 고대 그리스 소요학파는 명상에 잠기며 걷기를 즐겼다. 그러나 대간산행은 그럴 여유가 없다. 땅도 때론 경전이 된다하여 답경(踏經)이라 했는데 오늘은 적설량이 많아 힘이 더 든다. '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몸은 늘어지고 …' 가끔 이런 때 대원들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따끈한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한잔' 아니 '얼큰한 찌개에 막걸리 한 잔'이란다. 말끝마다 한 잔이다. 걷는다는 것이 단순행위인 만큼 오래 걷다보면 생각도 단순해진다. 노자(老子)의 지적처럼 '다즉혹(多則惑) 소즉득(少則得)'이라 욕심을 낮추니 만족이라도 얻어지는 것일까. 통상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는 1400~1800km로 알려져 있다. 남한구간만 하더라도 640km에서 포항 셀파 산악회에서 실측한 735.6km까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나 정확한 거리는 어쩌면 땅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최신 GPS로 측정한 거리는 680km라 하니 적어도 우리는 대략 340km이상, 팔백여리를 걸어온 셈이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거리의 절반을 왔고 시간상으로는 1년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대간산행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다. 절반이라면 가다 안 되면 돌아가면 된다는 의미일수도 있지만 문득 되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에 살아가야 할 인생살이처럼 그냥 가야 할 것 같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하면서…. 조관형 수필가·동해펄프산악회장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